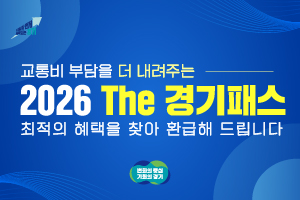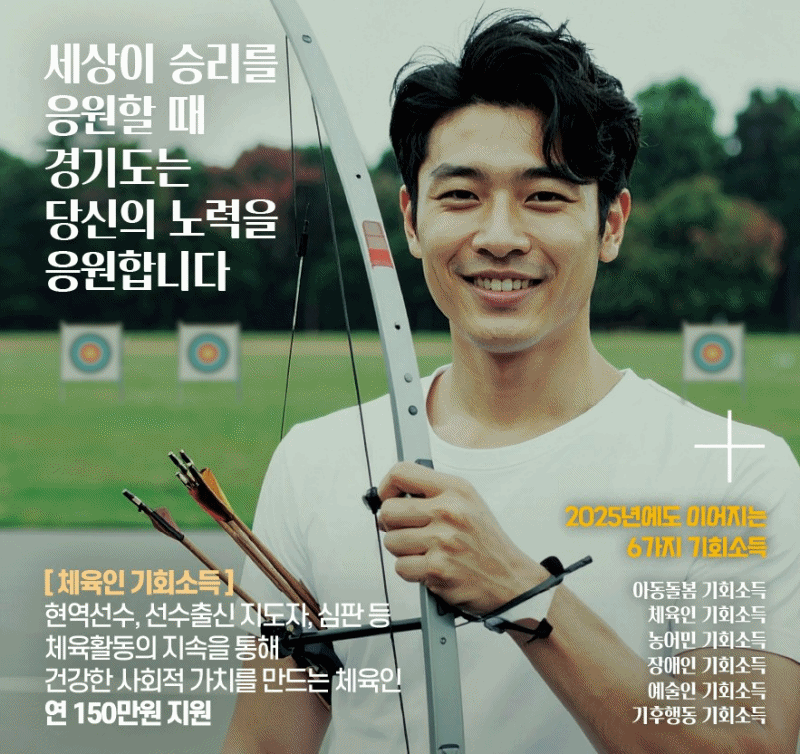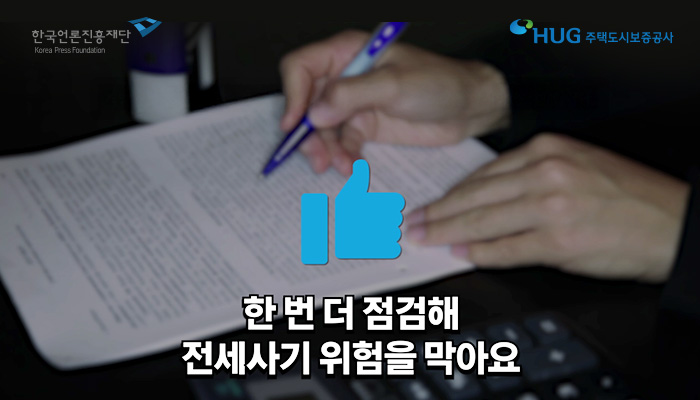새 한 마리
햇볕 한 줌 물고
능소화 꽃을 바라봅니다
능소화 꽃도 물끄러미
새를 바라봅니다
파란 하늘은 뭉게구름을 안고
뭉게구름은 온 세상을 안고 있습니다
점보다 작은 세상 속에서
새 한 마리 바람 길을 따라
날아가고 있습니다.
휘청거리며 날고 있는 새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과 햇살
바람과 꽃을 품고 있는 새 한 마리
새가 세상을 만들고
새가 만든 세상 속에서
꽃들은 피고 있습니다
새 한 마리
그리움이 몰려 올 때는
날개깃에 부리를 감추고 잠이 듭니다.

김재자 시인
경기 화성 출생 / 일간지에 ‘노랑부리 백로’ 등을 발표 작품 활동 / 시집 '말 못하는 새'가 있으며 글샘동인, 현재 용인병원유지재단 행정부원장 역임
-시작메모-
새는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생명체다. 새는 사람을 닮아가고 사람 또한 새를 닮아 간다. 우리 주위에서 눈을 뜨면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것이 새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새처럼 날고 싶은 마음에 결국은 하늘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었다. 시인은 새를 모티브로 하여 평소 가슴에 품었던 마음을 한 편의 시로써 풀어냈다. 새를 근간으로 요즘 한창 피고 있는 능소화, 그리고 햇살과 파란하늘, 바람과 구름을 적당히 버무려서 거대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시 속에서 하나의 행간으로 꾸며진 ‘휘청거리며 날고 있는 새’ 와 ‘바람‘은 어쩌면 시인이 걸어 온 힘겨운 인생일지도 모른다.
정겸(시인/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