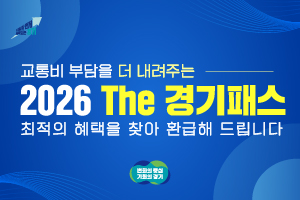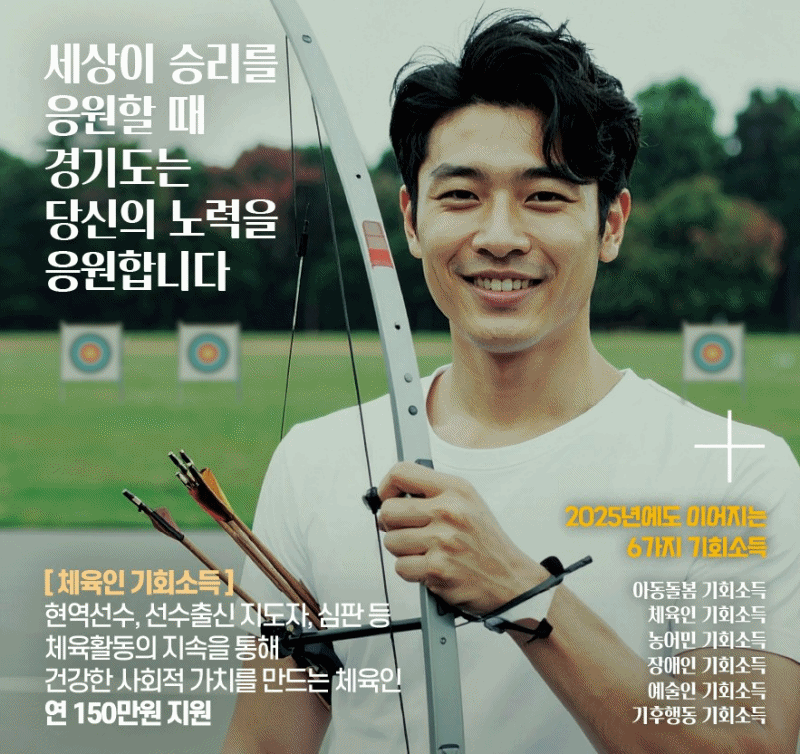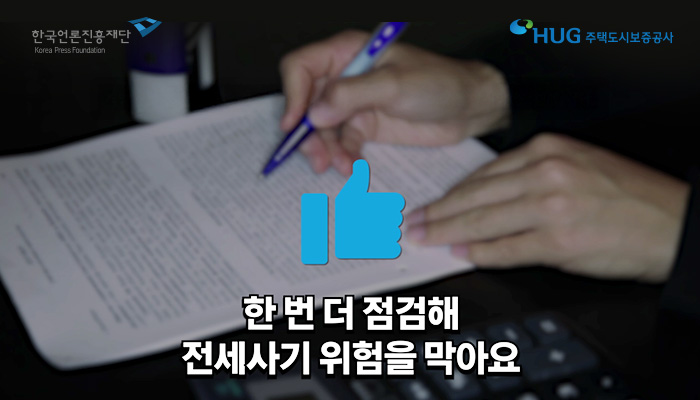내가 나무라면
너는 새가 되어 주렴
네가 나무라면
나는 새가 되어 줄께
오래 오래 걸어왔던
꼬불꼬불 황톳길
어느새
노랑 민들레꽃 함초롬 피었네
뒤돌아보니 아스라이 보이는
멀고 먼 그 길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았지
나무 한그루 새 한 마리
우리는 해와 달, 비, 구름, 바람
그 사이에서 걸어 왔던 거야

김재자 시인
경기 화성 출생 / 일간지에 ‘노랑부리 백로’ 등을 발표 작품 활동 / 시집 '말 못하는 새'가 있으며 글샘동인, 현재 용인병원유지재단 행정부원장 역임
-시작메모-
참 읽기 편한 시다. 그러나 몇 번을 읽고 나면 읽을 수로 시속에 숨겨진 철학을 알 수 있다. 인생이란 길고 긴 세월을 나무와 새를 통해 내면의 세계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나무와 새는 어쩌면 삶이라는 머나먼 길을 같이 걸어가는 길동무다. 한참을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니 멀리도 걸어 온 것이다. 시인은 걸어오는 동안에 겪은 세상 속 이야기를 해와 달, 비, 구름 바람 사이에서 살아 왔다고 독백한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다.
정겸(시인/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