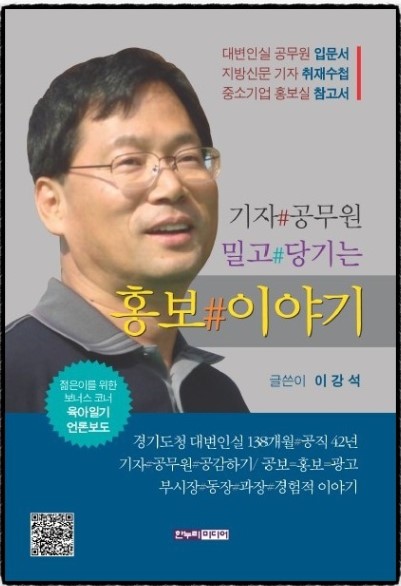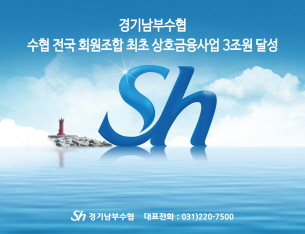바쁜 시대를 사는 우리는 고유한 전통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조상의 묘를 돌보는 벌초가 그 일이다. 處暑(처서)가 지나면서 종손들은 벌초를 걱정한다.
고향 떠난 자식들의 입장으로 보면 고향가는 길도 막히고 직장생활에 얽매여 살면서 하루 시간내기가 어렵고 고향을 지키는 맏형이나 아버지 입장도 고향 떠나 도시에 살고있는 30대 동생, 아들, 조카들을 불러 내리기 어려운 것도 매한가지이다.
젊은이들의 심정도 비슷하다. 어린시절 都會地(도회지)로 유학 나온 젊은이들의 고향에 대한 기억이라야 논두렁콩 건너 다니던 학교길과 사계절 바뀌던 뒷동산의 경치가 전부일 것이다. 도무지, 조상을 모시는 일이라야 명절에 두 번과 조부모 제삿날을 시골에서 걸려온 부모님 전화를 받고서야 마지못해 내려가는 실정이 아니던가.
핵가족 시대인 요즈음은 조상님 모시는 일에 관하여 신세대 아내를 설득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제사를 지낸다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고 따지면 대답이 궁해진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맥을 이어 왔으니 나도 그리한다는 논리가 먹히지 않는다.
매년, 매번 아내를 달래는 일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속마음 감추고 시골길을 먼지 날리며 내려와 주는 며느리는 칭찬해주고 싶은 여성이다. 현대 여성이지만 존경받을 인물이다.
아마도 많은 젊은이들은 아내와의 대화에서 논리 부족으로 고향 방문을 포기했을 것이다. 지난번 추석에 제사지냈으면 그만이지 돌아가신 전날 밤 12시까지 기다려 지내는 제사에 아내를 참석시킬 만큼의 권위는 오래전에 상실되었다.
솔직히, 제사 지나는 풍습은 좋은 전통이기는 하지만 여성에게는 힘에 겨운 일이다. 핵가족 며느리야 淸酒(청주)와 과일 한바구니, 그리고 부모님 용돈 십원만 준비하면 그만이고 제사를 지내고 도회지 집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한달정도는 기세 등등할 일이다.
이웃집 아저씨와 비교될 때 남편들은 고개를 숙인다고 한다. 봉급을 얼마를 타고, 보너스가 200% 나오고, 아이들과 놀이동산에 다녀오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피우고. 도무지 이웃집 아저씨는 이 시대의 표본적인 인물이다. 여기에 더하여 시할아버지 제사까지 다녀왔으니 며느리의 기세는 아파트 옥상을 올라 하늘까지 드높다.
현실이 이러한데, 조상 묘소 벌초에라도 다녀왔다면 그 기세가 어떠할까. 하지만 우리가 잠시 잊은 것이 있다. 우리 어머니들의 젊은 시절을 망각하고 있다.
우선 대가족이 살았던 70년대 초까지 방 4개짜리 집에 15명 정도가 살았다. 아침식사 시간에 밥상 4개를 보아야 했다.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손자·손녀가 한 상, 머리 조금 큰 삼촌과 초등학생 조카들이 두 번째 상, 아버지와 중고등학생, 일하는 아저씨 세 번째 상, 그리고 젖먹이와 며느리, 어머니들이 네 번째 상을 차려 밥그릇을 바닥에 놓고 식사중간 반찬도 나르고 숭늉도 드리면서 본인들은 체할 정도로 급하게 드셨다.
이래서 우리의 어머니들은 속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나보다. 거기에 속상하는 일이 겹쳤겠지만.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나면 어느새 새참시간이요, 연이어 점심을 준비해야 한다. 점심은 광주리에 담아 논이나 밭으로 날라야 한다. 저녁은 또 한 번의 전쟁터다.
조금 늦기라도 하면 큰기침, 작은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요즘같이 접시 몇 개 차리는 중에도 남편이 도와주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던 당시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딱한 일이다. 이것은 일상의 생활 모습이다. 겨울철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 내내 반복되는 생활이다.
그리고 제사라도 다가오면 더더욱 바쁘다. 없는 집 제삿날 돌아오듯 한다. 돈 쓸 일이 자주 생긴다는 말일 것이다. 귀찮은 일이 자주 찾아 올때도 쓰는 말이다.
제사를 준비해 본다. D-2일에 콩을 담궈야 한다. 이미 보름전에 제사에 쓸 술은 담가 둔 터이다. 떡쌀도 준비해야 하고 부침꺼리도 마련해야 한다. D일은 정말로 바쁘다. 아침일찍 떡을 만들고, 불린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든다.
두부는 콩물과 간수의 조화다. 觸媒(촉매) 역할을 한 간수는 빠져 나간다. 콩물을 짜내고 남은 것을 비지라 하는데 이것을 여러 해 동안 얻어먹은 주인집 소는 제삿날 비지를 주지 않으면 식사 타박을 하기도 한단다.
저녁이 되면 여러 가지 제수가 준비된다. 두부 붙침이, 강정, 떡, 나물, 무와 다시마의 조화를 이루는 탕국도 끓인다. 저녁 6시를 전후해 도회지에서 내려오는 삼촌, 조카, 동서를 맞아들여야 하고 닭을 잡아 고아야 한다.
3적이라 하여 행세하는 집안은 세 가지 적을 준비한다. 네다리 肉炙(육적), 물고기 魚炙(어적), 날개달린 鳳炙(봉적)이 그것이다. 과일을 차리는 것은 물론이다. 과일 중 털이 있는 과일은 제사상에 오르지 못한다. 복숭아는 제사에 쓸 수 없는 과일이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사상에서 국을 내리고 슝늉을 올려야 한다. 숭늉은 미리 끓인 물을 식힌 것이다.
제사 후 우리의 어머니는 짐을 꾸려야 한다. 도회지로 돌아가는 손아래 동서에게 이것저것 농산물을 쌈쌈이 올려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받은 사람이야 별 것 아니라 하겠지만 주는 손위 同壻(동서)는 항아리가 텅텅 빈다.
이렇듯 고생하는 큰며느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도회지에서 1년에 몇 번 내려오는 둘째, 셋째 며느리가 사오는 옷 한 벌은 시어머니에게 있어서 효부, 효자가 되게 한다. 둘째, 셋째 며느리여, 큰동서 옷 한 벌 사가지고 가자. 동네 패션에서 살 수 있는 싸구려 한 벌이라도.
8월말과 9월초는 벌초의 시기이다. 벌초 작업은 야유회로 운영하는 문중도 있다. 차 여러 대에 형제, 조카들이 밥, 반찬, 과일, 음료수를 분담하여 함께 모이는 대가족 야유회가 되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뿌리를 알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벌초와 제사에 대한 새로운 사회의식을 심어나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원로가 없는 이 시대에, 돌아가신 조상이라도 제대로 모시는 모습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다.
 [저자 약력]
[저자 약력]
-1958년 화성 비봉 출생
-경기도청 홍보팀장, 공보과장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화성시 시민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