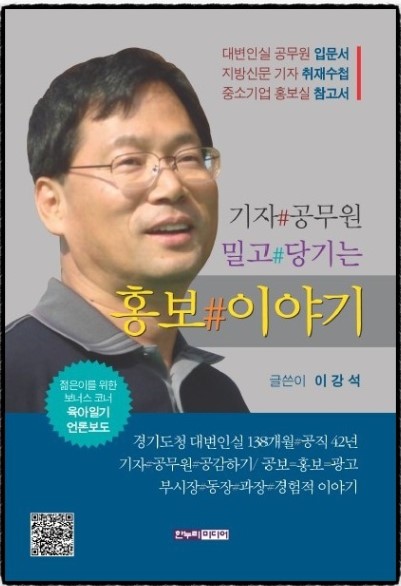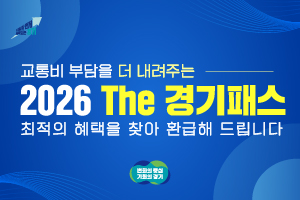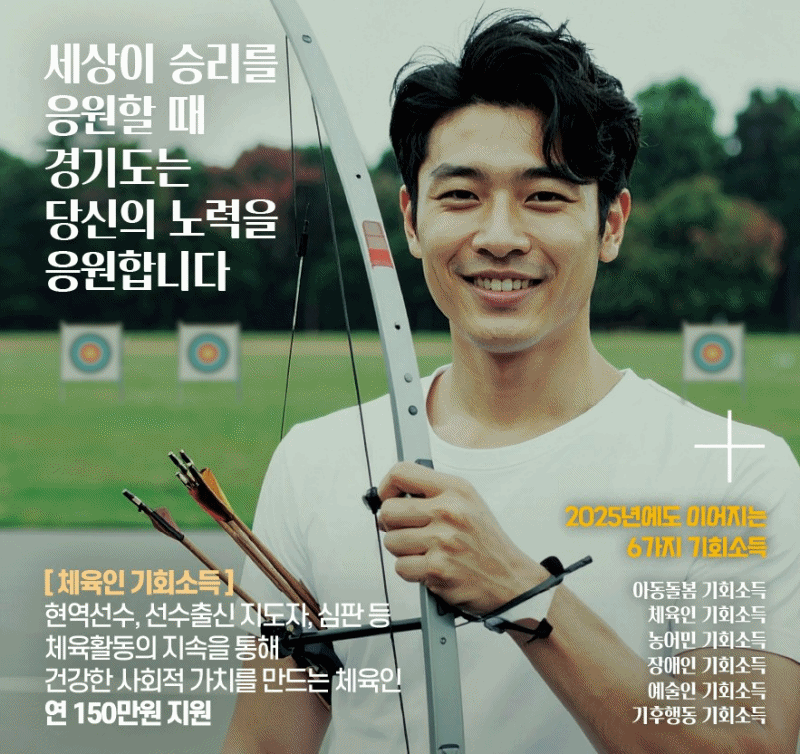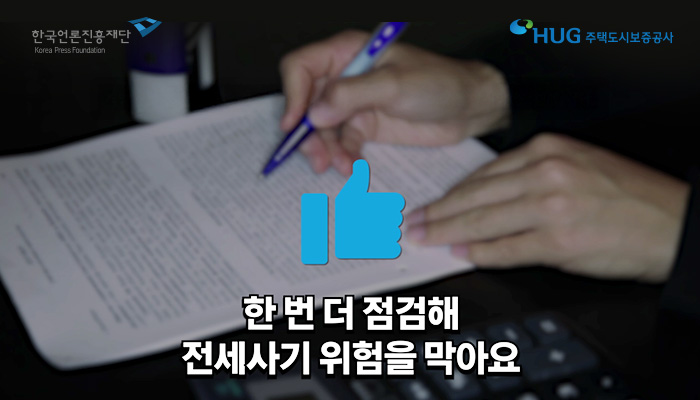↓

신문기사의 마무리는 편집부입니다. 취재기자의 송고는 첫 문장부터 시작되며 데스크를 거쳐 편집부로 넘어오면 평소 신문 편집에 정통한 편집 전문 기자들이 제목을 정하고 기사를 배치합니다.
물론 1면 톱이나 두 번째 기사, 면 톱의 경우에는 편집회의에서 정하지만 그 외의 자잘한 기사는 편집부 기자의 작명과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게 됩니다. 기사의 경중은 편집부의 고민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로쓰기 신문시절, 세로쓰기는 지적이나 비판기사이고 가로쓰기는 홍보성으로 보이는 듯 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홍보기사 제목의 바탕에는 비단 무늬가 있지만 지적 비판기사 제목은 그냥 흑백으로 처리하여 강한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강력한 비판의 경우는 검은 판에 흰 글씨가 나오는데 이는 기사제목의 글씨는 흰 종이 원단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공간을 온통 검정 잉크로 인쇄를 하니 이를 일러 신문에 도배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펼쳐 보아도 웬만한 대문짝보다 크지 않을 것인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문기사의 전파성과 기사제목의 위용을 평가하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때로는 취재기자의 기사 논조보다는 편집기자가 뽑은 제목의 강도, 편집국장의 기사배치 등이 언론사의 의지, 사시를 반영한다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사에서는 취재기자 특종상 등과 함께 편집기자상을 따로 시상하고 있고 사진 기자상도 별도의 파트로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문지면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남는 것도 아닌 것이 바로 편집부 기자의 마술인 것이지요.
짧은 기사문이지만 내용이 크면 제목을 키우면 되는 것이고 길고 장황한 기사지만 제목은 작고 기사문이 다른 기사 틈새를 비집고 돌아다니는 틈새시장 기사도 가끔 보입니다.
특히 중앙지의 지방판 기사의 경우 밀려드는 기사를 수용하기에는 늘 신문 지면이 부족하여 4단 정도 제목이 될 법한 기사도 2단 제목으로 축소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쩌다가 기대 이상으로 보통 행사사진이 아주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기사 원고량이 적은 경우 제목만 큰 글씨로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일 때 사진을 크게 배치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는 바입니다. 물론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문에서 사진의 중요성은 더 많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즉, 사건사고 현장을 신문 1개면을 할애하여 설명한다 해도 1장의 사진을 설명해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은 사진 한장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글로 설명이 필요가 없는 사진기사야 말로 신문의 힘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장님의 언론사 방문시에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만 모시지 말고 편집부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라 당부드립니다. 편집부는 다른 기관장 방문시 들르지 않는 부서이니 희소성도 있고 나중에 우리 기관의 기사가 올라가면 한 글자라도 부드럽게 처리해 줄 것이며 아기자기한 기사 제목으로 한번 더 업그레이드 된 홍보효과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를 만들어 언론사 방문은 2일로 잡아 문화체육부도 들러야 하며, 어느 언론사를 1일차에 방문 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출입기자의 파워와 각 언론사의 위상을 사전에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언론사 방문순서를 결정하기 힘들면 언론사를 지도에 표시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순로를 따라 돌도록 하면 어느 출입기자나 편집국장의 항변에 해명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 약력]
[저자 약력]
-1958년 화성 비봉 출생
-경기도청 홍보팀장, 공보과장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민회장학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