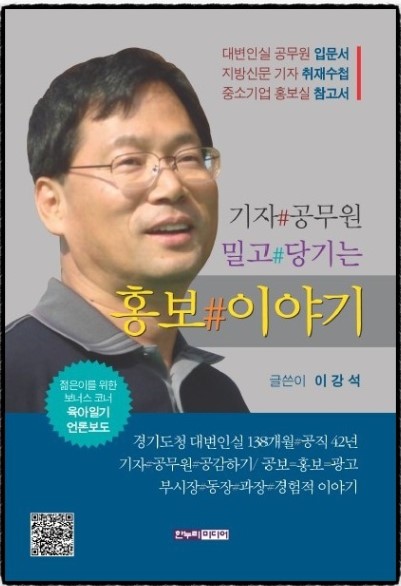### 수년 전에 공업용 '우지라면'사건이 크게 보도되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일이 있었습니다만 공업용 우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소에서 기름을 발라낼 때 공업용으로 쓸 요량으로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여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압니다. 소를 도축하면 나오는 흰색 덩어리 기름은 식용보다는 공업용에 쓰이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 우리의 시골 정육점(푸주간)에서 매주 매일 강조하는 오늘의 표어는 "고기는 냉장고에 있습니다."라는 흰 바탕에 붉은색 아크릴 표찰입니다. 좋은 고기는 냉장을 해야 하니 쇼윈도우에 걸어두지 못합니다. 그러니 혹시 손님들이 고기가 떨어져서 없는 줄 생각하고 발길을 돌릴 수도 있으므로 고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의 아크릴 표찰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증조할아버지 제사를 맞이하여 어머니께서는 초등생 아들에게 5km 걸어가서 다시 걸어오는 면사무소 인근 윤씨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 반근(300g)을 사오라 하십니다. 말표 검정색 고무신을 신고 타박타박 걷고 걸어서 두 고개를 넘어 면소재지 중심부에 자리한 정육점에 도착합니다.
소고기 반근을 주문하니 炙(적)꺼리냐 찌게꺼리냐를 물으십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적거리라 답하니 마블링으로 기억되는 붉은 판에 흰점이 박힌 고기 한편을 슥 잘라 누렁종이에 둘둘 말아 주십니다. 그리고 라면 2개정도 부피의 기름덩어리를 다른 종이에 포장해서 함께 내주십니다.
적거리 반근을 사오라 하셨는데 기름덩어리를 주시므로 반납했습니다. 이것을 사오라는 말씀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초보의 시행착오입니다. 소고기 반근을 사서 양념을 한 후 팬에 구워내면 정말 작은 고기 2-3첨이 되고 이를 작은 접시에 많아보이게 담는 시각적 마술을 부린 후 제사상에 올리는 것입니다.
魚炙(어적) 肉炙(육적) 鳳炙(봉적)이라 해서 3가지 고기를 올립니다. 어적은 조기, 육적은 소고기, 봉적은 삶은 닭을 말합니다.
소금에 절인 조기는 저장성이 있으므로 수 개월전 사두었다가 적으로 쪄내면 되고 살아있는 닭을 잡으니 어적과 봉적은 집에서 제조가 되는데 반해 육적인 소고기는 정육점에 가서 그 원재료를 사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고기 반근의 육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딸려오는 소기름이 더더욱 소중하다는 사실에 촉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후에 철길도 없는 시골마을에서 그 기차표 고무신을 신고 5km를 다시 걸어가서 윤씨 아저씨에게 오전에 고기를 반근 사갔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서비스 소기름을 받으러 왔다고 측은하게 말씀 드립니다.
키가 크고 얼굴선이 굵은 인자한 윤씨 아저씨는 "그러니까 아까 주는데 왜 안 가져갔어!"하시면서 오전보다 더 큰 기름덩이를 종이에 싸서 면사무소 민원창구처럼 높기만 한 정육점 테이블 가운데에서 더 키 작은 아이에게 기름뭉치를 내려 주십니다.
묵직한 기름덩이를 들고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5km가 그리 멀지 아니합니다. 요즘에는 2km도 참 멀게 느껴지는데 어린 시절 그 시골동네에서는 5km는 동네 마실 가는 기분으로 오가는 거리입니다.
더구나 오전의 실수를 만회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기름덩이를 들었는데도 몸이 무겁지 않은 것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멘탈의 파워입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우지기름을 보여드리니 반가워하십니다. 신 김치에 한 조각 넣어 푹 끓여내면 온가족이 맛있게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기름과 김치의 조합을 아십니다. 신 김치의 꿀꿀하면서 매운 맛을 어느새 초콜릿 향으로 바꿔주는 마술의 우지를 수 십년째 경험하셨기에 말입니다.
할아버지 고모 형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신 김치를 푹 삶아 양푼에 담아 식탁 가운데에 올렸습니다. 젓가락이 오가고 숫가락이 분홍색 국물을 퍼갑니다. 지금도 시골스러운 가족들의 언어가 기억납니다. 국물 맛이 '구드럭하다'했습니다.
무어랄까, MSG가 들어간 듯 국물에서 혀를 자극하는 맛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도 노랑색 기름이 동동 떠다니는 국물을 후르륵, 호로로 먹으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불판에 고기를 구워먹으면서 가위로 잘라버리는 기름덩이를 보면서 45년전 5km를 한 번 더 왕복하여 받아들고 신이 났던 우지기름을 떠올려 봅니다. 같은 기름, 소기름인데 당시에는 행복했고 지금은 눈앞에서 버려지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요.
신 김치에 우지를 넣어 끓인 씨레기를 먹으면서 어쩌다가 다 녹지 못한 기름덩이의 뿌리를 보면 냉큼 집어먹었던 그 기억을 어찌 지우라 하시는지요. 우지의 향수는 머리속에서 도저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메마른 소장과 대장에 기름기를 칠해 주었던 소기름 우지에 대한 기억을 절대 지우지 않고 살아가면서 소고기를 먹는 날에는 그날을 회상하면서 한 점도 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소고기를 팬에 구워 가위로 잘라가며 먹었는지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고기에서 기름끝을 잘라버리는 우를 절대 범해서는 아니된다는 말입니다.

[약력]
-1958년 화성 비봉 출생
-경기도청 홍보팀장, 공보과장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화성시 시민옴부즈만